우주먼지님의 블로그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의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다몇 년전 ‘국제경영전략’ 수업시간에 디즈니의 해외진출전략을 분석한 학우분이 계셨다. 상황은 꽤 재밌게 흘러갔는데, 흑인 인어공주와 같은 디즈니의 PC주의에 대한 논쟁이 타올랐기 때문이다. 학우분들의 논쟁은 수업 절반가량 이어졌지만 감정적으로 치달아 아쉽게 끝났다. 하지만 우리 대학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현재 미국에서도 PC, 즉 정치적 올바름은 타오르는 핵심 어젠다이다. 최근 미국 학교 및 공공도서관의 LGBT, 인종문제를 다룬 책을 금서로 지정하겠다는 법이 제정된 후 보수진보 간 대립이 이어졌다. 내 주변에서 벌어진 두 사건 때문에 이 책을 보자마자 샀다.
이 두 사건이 무관하지 않은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책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간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과도한 검열과 자유 침해가 미국 우파 포퓰리스트의 부상을 이끌었다고 말한다. 좌파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민주주의의 타락을 이끌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디즈니를 포함한 예술계의 정치적 올바름 문제에 관해서 알고 싶었지만 막상 그런 내용은 없다. 대신 언론과 대학, 직장 등에서 벌어지는 PC운동, 캔슬컬쳐의 문제를 짚고 있다. 진짜 공감이 많이 가기도 하고 흥미로웠다.


저자는 일본 오타쿠계 문화를 포스트 모던과 연결하여 해석한다. 2차대전 이후 사라진 대서사를 오타쿠 문화로 채우려했고, 종래에는 오타쿠들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조합들을 소비하는데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펼친다.
"시뮬라스크 수준에서의 동물성과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의 인간성의 해리적 공존"이 곧 포스트모던사회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말이다. 정말 흥미로운 책이다. 저자는 2층 구조를 인터넷 사회까지 적용하는데, 흥미로운 해석임을 나아가 예술적이기까지 한 듯.
한편 저자가 적용한 포스트모던 모델을 내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오타쿠까진 아니었지만 애니광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시절 나는 왜 침대에 누워 수많은 애니를 봤나? 코로나로 잃어버린 일상의 무언가를 혼자서라도 채워야겠다는 동물적 감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만약 내가 올해 취업에 실패하면 꼭 아일랜드로 뜨겠다!'는 다짐이 3월 초부터 생겼다. 그래서 가끔 너�무 힘들 때면 키위 앱으로 최저가 더블린행 비행기 표를 찾아보곤 한다 ;( 난 영국 북쪽의 칙칙한 날씨와 그 속 자유로움을 사랑한다.
이 책을 읽곤 그 성긴 여행계획에 스코틀랜드 아일레이 섬을 추가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선 아이리쉬펍에 출석체크하듯 가야지, 거기서 흑맥주와 싱글몰트에 취한 채로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날의 초상'을 '완독'해야지. 등등 제법 구체적으로 여행을 그려봤다. 난 이 여행이 실현되길 바라면서도 바라지 않는다 하하!


영문학과 사랑에 빠진 스토너의 삶.
스토너는 시를 아끼는 마음을 알고, 책 속 죽은 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고독의 시간을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책을 읽는 동안 순수함을 위해 살아가는 그의 삶을 사랑했다. 요즘 우리 세대의 경우 국문학과 사랑에 빠지는 일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취급받고 혹여 사랑에 빠진다면 굶어죽을 거지만,,, ;// 암튼 그는 그가 쓴 하나의 책으로 남았다. 그 속에 영원히 갇혀서 죽었다.
"이건 사랑일세, 스토너 군. 자네는 사랑에 빠졌어. 아주 간단한 이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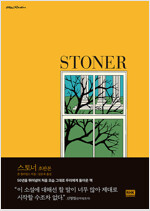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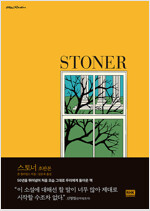
“진리의 가장 큰 적은 거짓말이 아니라 개소리다.”
개소리는 곧 진리에 관한 무관심이기 때문이다. 가짜뉴스가 판치는 요세상에 기억할 것! 오보와 허위조작정보는 다르다는 말��과 결이 비슷하다.


모두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여자, 타시는 아마도 테니스를 사랑했던 것 같다. 그녀 옆자리를 두고 다투는 두 남자보다도…마지막 타이브레이크 중 서로를 얼싸안는 두 남자의 경기는 뜨겁다. 테니스시합 연출도, 힙한 음향도 좋았다. 진짜 ‘Come on’이다!!!!


며칠 전 ‘패리스 힐튼을 찾습니다’를 우연히 읽다가 이 책까지 빌려보게 됐다. 심각하거나 슬픈 순간에 나오는 유머 때문에 피식피식 웃게 됐다. 그러다가도 이야기가 끝맺을 무렵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주인공은 나와 정말 많이 다른 사람이지만, 느끼는 감정은 비슷했다. 그게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다. 글을 읽다가 문득 작가가 궁금해져 유튜브 영상을 몇 개 찾아봤는데 책날개의 사진과 달리 굉장히 귀여우셨다 :))


저번주 일요일엔 영화관에 가지 않았다. 딱히 보고 싶은 영화가 없다. 10년도 더 넘은 이 영화를 봤다. 보다보니 갈증이 나 맥주도 마셨다.
"니 어데 최씨고?"
우리 사회에 밈처럼 각인된 최�민식의 유명한 대사는 영화의 메시지마저 함축하고 있다. 특히 깡패의 브레인이었던 최민식과 검사가 된 그의 아들이 돌잔치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결말은 상징적이다. 영화 내내 위기를 돌파하던 가족, 집안, 핏줄이라는 이야기 장치는 결말에 이르러 블랙 유머의 상징이 된다. 가족처럼 굴던 깡패는 분열하고, 검찰과 깡패는 가족처럼 가깝다는 사실에 시원찮게 웃었다.
10년 뒤엔 이 영화를 또 봐야겠다. 블랙 코미디가 그리우므로, 배우들의 어색한 부산 사투리가 생각나므로, 대사에서 풍기는 웃픔을 떠올리고 싶으므로.


김연수 작가 아저씨의 책들에는 '인생을 두 번 산다/살 수 있다'의 말이 자주 나온다. 사실 그의 책을 여러 권 봤음에도 그 말은 좀체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확실히 알게 된 거 같다.
실제 삶을 살아가며 한 번, 이미 쓰여진 문장으로 한 번 더 산다. 그리고 두 번째 삶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이 책을 덮은 뒤로 김연수 아저씨의 문학 인생을 다시 한번 더 살아 내고 싶어졌다. <꾿빠이, 이상>도, <일곱 해의 마지막>도 모두 다시 펴고 싶다.


이념은 모두 잘 살자고 만들어낸 것이다.
이 말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나아가 종교까지 모든 사상의 궁극적 목표다. 하지만 이론은 현실에서 실현되면서 이내 뒤틀리고 부서진다. ‘영웅시대’ 또한 6.25전쟁의 실상을 그려내며 이념의 왜곡과 영락을 보여준다.
여담으로 소설을 읽기 전 서문을 보면서 자주 감동받곤 하는데, 이문열 작가의 초판 서문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서문들 중 하나다. (위화의 ‘인생’ 서문을 이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