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자아는 숭고의 탄생지다: 서미애와 칸트> 를 읽으면서 작품들의 구조를 정리한 대목에서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위에서 박소해 작가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중언부언하기는 그렇고, 개인적으로 "서미애 작가님의 소설은 홈스 계열이 아니라 체스터튼의 뒤에서 읽혀야 한다"는 언급이 눈에 띄었습니다. 추리소설에서 범죄와 범인을 다루는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할 것이고, 그중 작가가 범죄와 범인을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를 두고 이 두 계열이 갈리는 듯합니다. 체스터튼의 방법론이 탐정이 종교인(가톨릭 신부)이라는 점에 큰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만, 추리소설을 더욱 풍요롭고 깊게 만들 방향성 또한 이쪽 계열의 탐구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왔었습니다.(제가 존경하는 추리소설 작가가 체스터튼입니다... 편향성이 있는 발언임에 유의해 주십시오.) 백휴 평론가님의 분석을 따라가면서 체스터튼의 이름을 만나고 무척 반가웠음을 밝힙니다.
[박소해의 장르살롱] 13. 추리소설로 철학하기
D-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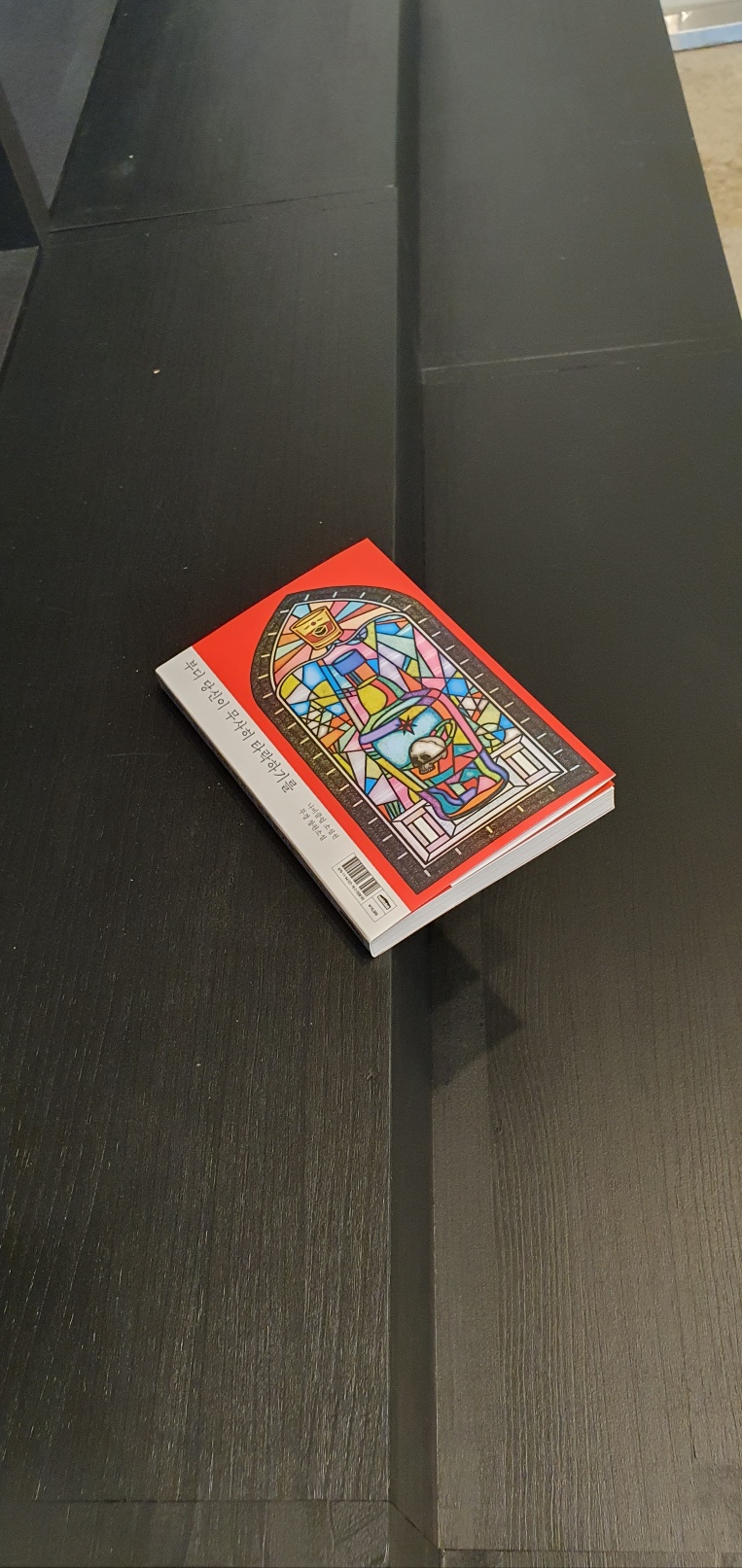
무경

박소해
저도 그 점이 흥미로우면서도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점이었습니다. 류성희 작가님과 서미애 작가님 작품들이 가진 특성을 백휴 작가님이 소개하시는 철학적 관점으로 들여다보니 한결 이해하기 쉬웠고 아하! 하고 와닿는 지점이 많았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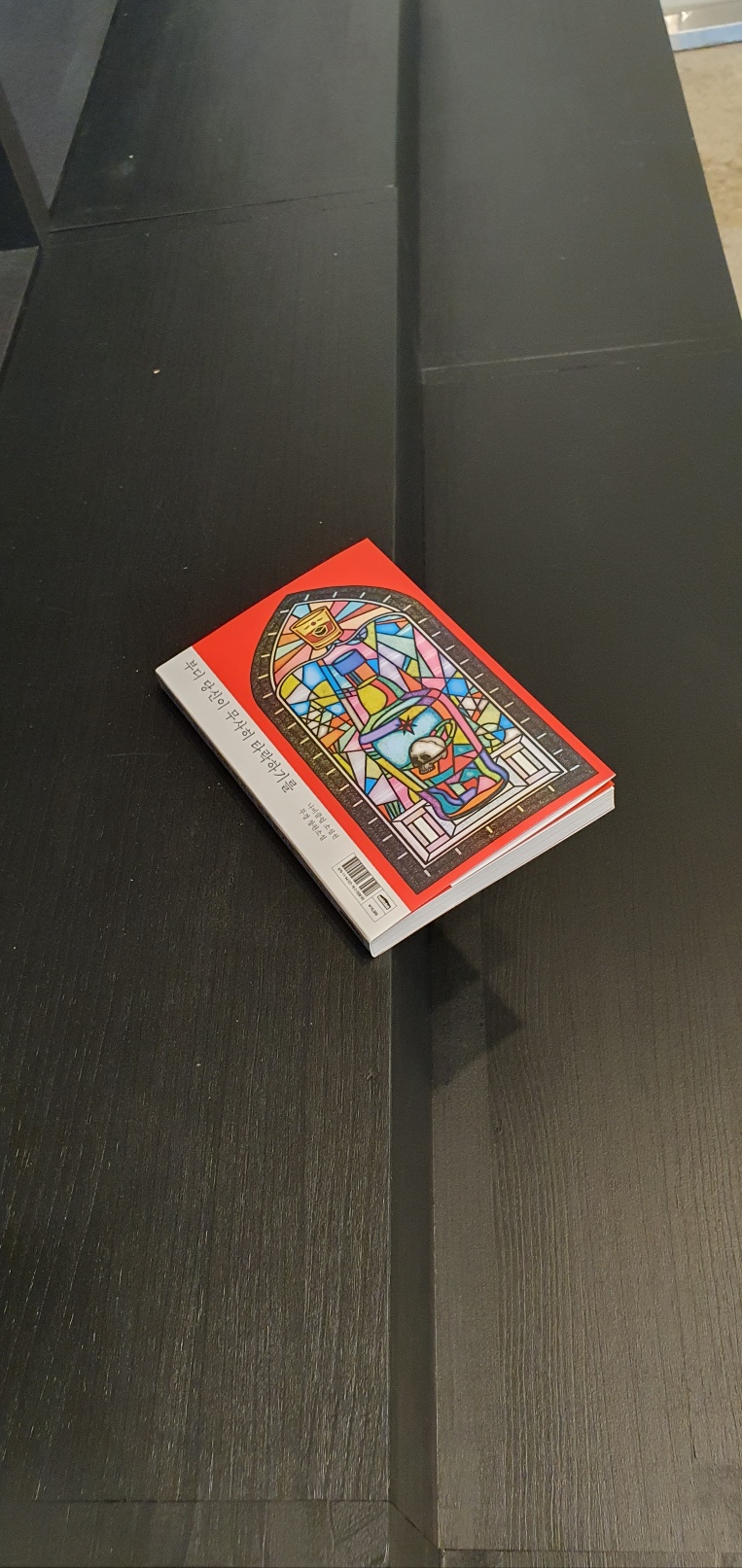
무경
<변증법을 이해하는 자의 유머감각: 황세연과 슬라보예 지젝> 파트는, 바�로 이전 장르살롱 모임에서 황세연 작가님의 책을 다루었기에 좀 더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자면, 황세연 작가님의 스타일을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써보고 싶지만 흉내 내지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더욱 그러합니다. 지난 장르살롱에서 황세연 작가님의 저력을 작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번 장르살롱에서는 그분의 가벼운 듯 뜻밖에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그 손놀림의 비결(손맛?)을 슬쩍 엿본 듯합니다. 이 파트의 초반부가 실화인지 소설인지 모르는 특이한 서술인 점 역시 황세연 작가님에 대한 백휴 평론가님의 오마주인 것 같다고 생각하며 쭉 읽었습니다. 한국의 작가들을 통틀어 아이러니를 이렇게 잘 휘두르시는 분이 또 있을까? 를 생각했습니다. 황세연 작가님이 여전히 읽혀질 이유를 분석한 좋은 글이었습니다.

박소해
저는 황세연 작가님 작품들 속에 도드라지는 유머 코드를 워낙 좋아해서 예전부터 황 작가님의 팬이었습니다. 황세연 작가님은 이야기의 톤과 어조는 한국식(이 점이 중요합니다! 매우 한국적이라는 것...! 여기에서 많은 독자님들이 친근감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위트와 유머가 넘치지만 트릭의 전개나 설계를 들여다보면 ‘까도남’ 같은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백휴 작가님이 10장에서 잘 설명해주신 듯합니다.

나비클럽마케터
지난주 금요일에 철학 전문 서점 소요서가에서 백휴 작가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주로 추리소설보단 철학에 익숙하신 분들이 참여하셔서 또다른 의미로 흥미로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가지 못하고 <��계간 미스터리> 한이 편집장님이 참여하셨는데 20대부터 중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추리소설과 철학의 상관관계' 강의에 대해 흥미롭게 들으셨다고 하네요. Q&A시간에 '철학적 타자'에 대해 더 깊은 설명을 요청한다든지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고 하니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할 백휴 작가님과의 라이브 채팅도 기대됩니다ㅎㅎ


Henry
이번 주 금요일의 라이브채팅이 더욱 기다려지게 만들어 주시네요^^
미리미리 철학적 지식의 옷과 적절한 질문 보따리를 준비해둬야 할텐데 걱정이긴 합니다. 허나, 우리의 마스터, 아니 진행자님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진행력으로 흥미진진한 라이브 채팅으로 리딩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ㅎㅎ

박소해
헨리님의 질문은 늘 묻따 믿습니다.
금요일까지 전체 진도를 빼지 않아도 괜찮으니, 읽으신 부분에서만이라도 사전 질문을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꼭 라이브 채팅 때 만나요? :-)

박소해
제가 제주에 살아서 직접 가보지 못한 것이 안타깝네요. 틀림없이 좋은 시간이었을 거라 믿으며, 이번주에 진행할 라이브 채팅도 좋은 시간이 되도록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일단 밀린 진도부터 (10부~ 에필로그) 달려야겠네요. :-)

추리문학
황세연 에세이 첫부분을 소설형식으로 한 것에 대해 부연설명 올려봅니다. 다른 에세이와 달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황세연이 변증법을 텍스트밖 현실로까지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황세연 작가를, 아니 황세연이라는 사람을 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서는 DDR의 변증법을 말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2000년 무렵 당시 추리작가 협회장님이시던 이상우 작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황세연이 죽었다고 하니 확인해 달라고. 책에 유작이라는 말과 함께 부고가 실렸고 인터넷 기사도 뜬
상태였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나는 잠시동안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데~무협의 결계에 걸리듯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서야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 얘길 하려니 아는 사이임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형식을 취한 겁니다. 꼼꼼한 독자라면 눈치를 챌 수도 있었을 텐데~~에세이에서 저는 소심한 복수(~~나만의 나뭇결을 만들어 놓았다는 구절 언저리)를 했습니다. 이 에세이의 제목이 뭔지 황세연에게 물었던 거지요. <철두철미한 변증법적 사고의 소유자, 황세연 >, <아이러니스트, 황세연> 둘 중 어느 것이
진짜 제목일까요? 그리고 이 물음은 광장시장
막걸리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황세연이 변증법
을 텍스트밖으로 확장했듯) 물음으로써 나도 이
물음을 텍스트 밖으로 확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황세연 과 막걸리를 마시고 나서야 제 에세이는
끝났다고 말했죠^^

박소해
백휴 작가님, 자세한 사연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뒷이야기를 듣는 재미 때문에 제가 장르살롱을 못 놓는 것 같습니다. :-)
사실 원고 마감에 쫓기면서 틈틈이 살롱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항상 아슬아슬하긴 합니다. 작가가 글을 써야지 진행자를 하는 게 맞을까, 스스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롱 선정도서를 참여 독자님들과 함께 읽고 작가님, 독자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제 세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으니 살롱을 놓을 수가 없네요. 되도록이면 가늘고 기일게 오래오래 살롱을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계몽주의도 살롱에서 태동되었으니, 한국 장르문학 부흥에 제 장르살롱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화제로 지정된 대화

박소해
@모임
여러분 이번주 금요일 저녁 8시, 바로 여기에서 백휴 작가님, 나비클럽 마케터님이 참여하는 라이브 채팅이 있는 걸 잊지 않으셨죠?
제가 금주 일요일에 <추리소설로 철학하기> 방이 닫히면 당분간 칩거하며 원고 마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4월 중순 이후에 14번째 살롱을 열 것 같습니다.
지난 2023년 8월에 첫 장르살롱의 포문을 <호러만찬회>로 연 이후, 단 하루도 살롱 ‘근무’를 쉰 적이 없습니다. 아, 3주 쉰 적이 있군요. 바로 <제17회 한국추리문학상 황금펜상 수상작품집> 때인데요. 제 단편 <해녀의 아들>이 그 수상작품집에 실린데다가, 공교롭게도 본상을 받게 되는 바람에...;;;; 한이 회장님께서 대신해서 진행해주셨습니다. 그 3주가 방학 같고 그랬답니다. ^^ 근데 그 때도... 진행자는 아니었지만 참여 작가로 계속 함께했지요. ㅎㅎㅎ
아무튼... 근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요, 4월 중순 이후에 장르살롱 2시즌으로 새로운 독서목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때까진 장르살롱이 짧은 휴지기에 들어가게 되니... 이번 라이브 채팅 때 한분이라도 더 들어오셔서 같이 인사 나누고 신나게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nry
아, 이리도 성실한 진행자님 덕분에 장르살롱이 이렇게 넓고 깊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었고, 농반진반으로 중쇄제조기가 될 수 있었나봅니다. 그리고 시즌제 "박장살" 축하드립니다!

예스마담
장르살롱 휴식기..환영합니다! 1일 1독 숙제에 빠져 지내고 있어도 올라온 글들은 매일 읽어보고 있답니다. 그냥 온라인 수업인계지요^^ 장르살롱 시즌2도 응원합니다~ 그동안 쉼없이 달려오셨으니 글도 쓰셔야 하는데 잠깐이라도 쉬셔야지요..저도 쉬고요^^

장맥주
아, 휴식기에 들어가는 줄 알았으면 "추리소설로 철학하기" 참여할 걸...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작가님. 멋진 작품 기다릴게요!!

박소해
아, 긴 휴식은 아니고요, 이에 관해서 김 대표님께도 정중하게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2시즌에서는 좀 다른 컨셉으로 방을 만들어가보려고 합니다. :-)

장맥주
작품도 장르살롱 시즌2도 엄청 기대됩니다!

박소해
하핫, 감사합니다. 장맥주 작가님. 장르살롱이 잠시 휴지기를 갖는 동안에 그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맥주
넵!! 편히 다녀오세요, 작가님.

borumis
아쉽지만 차후 나올 박소해님의 작품도 기대됩니다. 덕분에 정말 좋은 책을 알게 되고 다른 작품들도 새로운 시선으로 읽어보게 될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화제로 지정된 대화

박소해
@모임
아, 그리고 금요일 라이브 채팅 전에 백휴 작가님께 드릴 질문을 사전에 받습니다.
사전 질문 >> 이런 식으로 표시 후 질문을 써주세요. :-)
작성
게시판
글타래
화제 모음
지정된 화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