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중 먹을 것이 귀한 환경이니 낚시 바늘로 먹이가 내려가면 귀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ㅎㅎ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서 비축하는 것도 중요할테니까요^^ 그런데 움직임 보다는 얼마나 물고기가 많으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물고기가 많은 곳에서는 잘 잡힐 테고 없는 곳에서는 잘 안잡히겠죠. 남극권 어장에는 물고기가 많아서 어업이 꽤 활성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도서증정][김세진 일러스트레이터+박숭현 과학자와 함께 읽는]<극지로 온 엉뚱한 질문들>
D-29

polus
졸려요
어업이 활성화되어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하긴 남극권에서 축산업을 하기도 힘들거고 채식만하며 살지 않을거니 당연한 걸까요? ㅎㅎ 극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멋진 질문들보다 저는 이런 소소하고 생활밀착형 질문들이 더 재밌게 느껴져요.

polus
@JJF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남극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메로입니다.^^; 남극권에서 잡은 물고기는 남극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중위도나 저위도에서 소비됩니다 ㅎㅎ 남극권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으니까요^^

ifrain
저는 메로 구이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찾아보니 고급 요리군요. 풍부한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을 갖고 있다고 하고.. 4가지 부위 중 몸통은 스테이크로 만들어 먹구요. 스페인어 'Merluza(메루자)'가 일본에서 '메로'로 바뀌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고.. ^^

센스민트
강추해요. 꼭 드셔보세요~^^

ifrain
추천해주셨는데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마음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해답을 찾은 듯 합니다.
눈부신 심연/ 헬렌 스케일스 지음/ 조은영 옮김/ 시공사
p.333
소비자는 해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해서 어디에 사는 동물이 어떻게 잡혀 왔는지를 따지고 심해 어종이라면 거부한다. 또한 심해와 심해에 감추어진 경이로움을 배우고 관심을 쏟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른 친숙한 동물이나 야생 지역처럼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도록 나서야 한다.
-----------------------------
사진으로 본 메로의 동그란 눈이 '나까지 먹으려고? '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센스민트
메로구이 맛있어서 자주 먹었는데 일본 음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어디에서 잡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관련 지식을 얻어 가네요ㅎ

ifrain
“ 2차 대전이 끝난 뒤 남극을 공동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남극조약이 맺어졌습니다. 남극조약에 따르면 남극에서는 과학 활동만 허용될 뿐 자원 개발은 할 수 없습니다. 개발하기엔 남극대륙을 아직 잘 모른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극조약이 맺어진 후를 남극의 과학시대라고 부릅니다. ”
『극지로 온 엉뚱한 질문들』 p.95, 박숭현 지음
문장모음 보기

ifrain
오늘 오랜만에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에 다녀왔어요. 1969년 11월 20일 국내 최초로 설립된 자연사박물관이지요. 역대 관장님 사진으로 연대표를 만들어놓은 것도 있었는데 사진으로 담지 못했네요. 로비를 들어서서 한층 올라가면 기획전을 하는 공간이구요. 한 층 더 올라가면 각종 표본을 상설 전시하고 있어요. 마침 기획전 주제가 ‘지구생물들의 기후변화 생존기’입니다. ‘극지로 온 엉뚱한 질문들’�과 겹치는 내용들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ifrain
대왕고래의 이야기도 한 번 들어볼까요? 아래 내용은 전시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안녕? 나는 대왕고래야. 흰수염고래, 푸른고래라고도 불려.
지구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동물이야. 여름에는 극 지방으로 갔다가 겨울에는 적도 해역에 있는 번식지로 먼 거리를 이동해.
우리는 크릴을 주로 먹어. 하루에 약 3.6톤 정도 먹지. 기후변화로 바다가 산성화되면서 크릴이 줄어 들었어. 크릴이 풍부한 곳으로 200~500km를 더 이동해야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아… 힘들어.. 우리는 죽으면 가라 앉아 먹이를 통해 흡수한 탄소가 대기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잡아두는 저장고 역할도 해. 한 마리당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지.
이 양은 나무 한 그루의 탄소 흡수량보다 더 많은 거야.


ifrain
�안녕? 난 새우와 닮은 크릴이야.
새우는 아니고 ‘난바다곤쟁이목’에 속하는 절지동물이란다.
우리는 엄청나게 큰 무리를 만들어 지구 바다 곳곳에서 살아.
남극에 사는 우리는 고래, 바다표범, 펭귄, 물고기들의 주요 먹이야.
최대 6cm 정도까지 자랄 정도로 큰 편이고, 수명도 6~7년이나 되지.
우리는 해빙 가장자리에서 식물플랑크톤을 먹고 살아.
그런데 해빙이 녹으면서 먹이를 찾고 살아갈 터전을 잃고 있어. 오존층이 얇아지면서 많은 자외선이 바다로 들어오는데, 해빙이 없으면 우리는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해. 또한 남극 바다가 산성화되면서 우리 몸을 둘러싼 외골격이 쉽게 용해되어버려.
더구나 너희가 우리를 낚시 미끼, 크릴 오일 등으로 쓴다고 마구 잡고 있지. 꼭 우리가 너희 생존에 필수가 아닌데 말이야. 남극에 사는 생물들에게는 우리가 꼭 있어야 함을 기억해주면 좋겠어.

Go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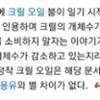

ifrain
“ 너도나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의 소지가 많아지자 과학자들이 나섰습니다. 남극 문제 해결에 과학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려면 극지를 둘러싼 국제 공동연구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구 환경을 이해하고 미래를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양극 연구는 필수입니다. 전 지구적인 대양과 대기, 대륙 간 상호 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극 연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극지는 워낙 넓고 위험하기에 개인 연구는 물론 국가 단위로도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일찌감치 극지 연구에는 국제 공동연구가 필수라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
『극지로 온 엉뚱한 질문들』 pp.108~109, 박숭현 지음
문장모음 보기

얼치기맘
책을 읽고, 모험가인 섀클턴에 대해서 알게 되었네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궁금해지네요.
https://namu.wiki/w/%EC%A0%9C%EA%B5%AD%20%EB%82%A8%EA%B7%B9%20%ED%9A%A1%EB%8B%A8%20%ED%83%90%ED%97%98%EB%8C%80

Jenna
인듀어런스호 사진집이 있어요. 저도 도서관에서 빌려봤는데, 당시 모습이 생생해요. 특히 책 속에도 실린 개들의 이야기는 뭉클해지죠. 개 한 마리 한마리 전부 다 이름이 있었더라고요.
GoHo
전에 TV 방송 알쓸에서 김영하 작가님이 새클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참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올려주신 링크로 더 자세히 알게 되었네요..
훌륭한 리더의 덕목은 어려운 게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끄는 무리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

ifrain
저도 올려주신 링크 덕분에 섀클턴의 모험 전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치피 여사(실제로는 수컷이었다는)에 대한 이야기도 인상적이네요.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지만 결단의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리더의 고충도 엿보이고요.

센스민트
섀클턴 얘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역시 Impossible is nothing! 영화로 보고 싶은데 제작되다가 무산되�었나 보네요.

ifrain
“ 과학자들에겐 남극이라는 중요한 영역이 특정 국가 영유가 되거나 분쟁 지역이 되면 관측과 연구에 많은 장애가 생기리란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남극대륙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사회는 과학자들의 이런 문제 제기를 수용했습니다. 미국이 당시 영유권을 주장하던 12개국을 초청해 남극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죠. 그 결과 1959년 남극조약이 채택됐고 1961년 발효됐습니다. 남극조약의 핵심은 남극대륙과 남극해에서 군사 활동을 금지하고 누구나 과학 조사와 연구 자유를 누리며 남극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
『극지로 온 엉뚱한 질문들』 p.110, 박숭현 지음
문장모음 보기

ifrain
과학·평화 아이콘 '남극', 경쟁의 무대 될까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네요.
남극조약을 맺을 당시와 달라진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극조약 체제에 균열 조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과학기지를 확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극지 연구에 예산을 축소하고 있구요. 남극조약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72678
작성
게시판
글타래
화제 모음
지정된 화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