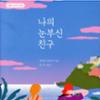“ <이제야 언니에게>를 읽고 제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말없이 가던 길을 가겠다. 그가 정말 제야를 이해 못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싫은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공감은 하지만 과장이 심한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그의 안전한 세상이 계속 유지되길 기원하겠다. 만약 제야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부터 들어볼 것이다.
그리고
제야를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죽어서 갈 영원한 지옥을 확신하기 위해서라도 신을 믿을 것이다. 그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줄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성범죄 피해자를 조롱하는 사람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사람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을. 남자에게만 앞길과 생계와 꿈과 가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을.
나는 생각한다. '초범'과 '선처'라는 말의 연관성을. 피해자가 또 나오기를 기다려보자는 뜻인가? 피해자의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가해자의 죽음에는 의문과 연민을 먼저 드러내는 사람을 생각한다. '왜 이제 와서'라는 말의 폭력성을 모르는 사람을, "이래서 여자는 안 된다"는 말의 몰염치함과 그런 말을 지껄일 수 있는 권력을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남자가 여자를 죽이면 '우발적·충동적 살인'이고 여자가 남자를 죽이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고 쓰는 법조인과 언론인을. 자기를 무시했다는 느낌만으로 남자가 여자를 죽였다는 뉴스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남자를 죽인 여자에게는 "그럴 것까진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을 생각한다. 남자는 그럴 수 있지만 여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숱한 경우를 생각한다. 그 모든 발언 밑에 깔린 '감히 여자가'란 경멸을 생각한다.
이제야를 성폭행한 친인척은 소설 말미에 시의원이 되겠다고 나선다. 어른들은 "그런 사람이 시의원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해자에게는 티끌인데 피해자에게는 낙인이자 올가미인 성범죄를 생각한다. 이게 말이 되는 문장인가?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세상의 구성원으로서 나는 죄책감과 분노와 무기력을 느낀다. 나는 가해자다. 나는 방관자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죽을 수도 있었다. 나는 내가 왜 살아 있는지 알 수 없다. 나는 생존자다. 나는 이제야의 이야기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제야 언니에게>나 <해가 지는 곳으로>를 읽은 독자 중에는 소설 속 성폭행 장면의 묘사가 꼭 필요했는가 묻는 사람도 있었다. 소설을 쓰던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후회한다. 드러내지 않고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했다. 더 많이 배워야 한다. 소설을 쓰면서 깨우쳐야 한다. 나아가야 한다. 소설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어떤 비밀』 최진영 지음

어떤 비밀『구의 증명』의 소설가 최진영, 그가 쓴 모든 소설의 ‘비밀’이 담긴 첫 산문집. 경칩에서 우수까지 24절기에 띄우는 편지를 완성하고 각각의 편지에 산문을 더해 꾸렸다. 아담한 로스터리 카페 ‘무한의 서’를 운영하는 연인에게 힘을 보태고 싶어 소설가 최진영은 절기마다 편지를 써서 찾아오는 이에게 전했다.
책장 바로가기
문장모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