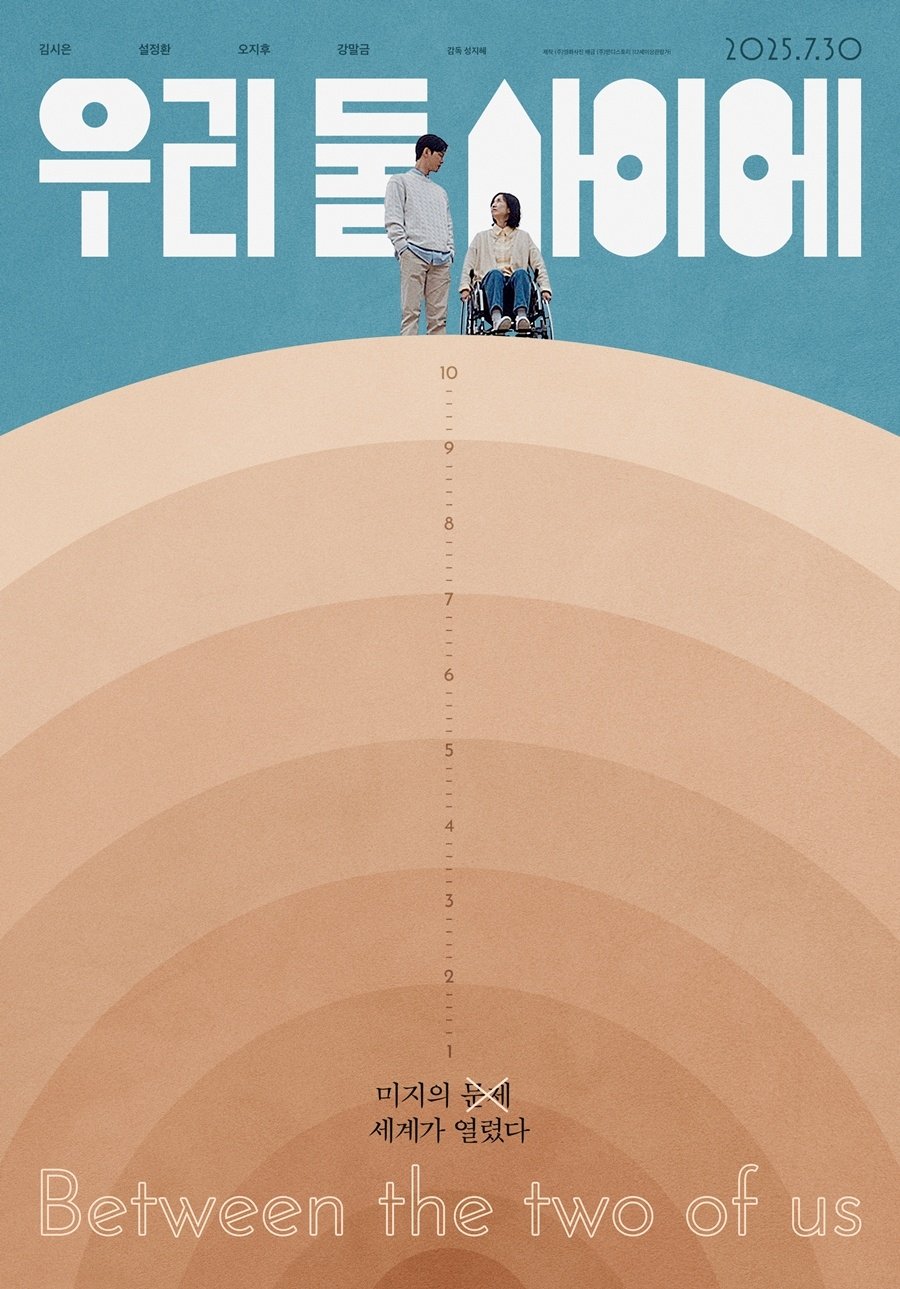저는 과거 장애인재단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에서 근무할 당시, 사귀던 전전전저... 남자친구가 하필(?) 특수교사이기도 했죠(시기상으로 얽힌 것이지 직장과 연애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었습니다.
재단 자체가 산하기관이 많은 편이라 장애인 근로자도 많았고(사내 식당과 카페 등), 복지관이나 센터, 병원 등에 재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성욕(본능적인 욕구죠)에 대해서도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몇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 제 말이 자칫 일반화처럼 여겨질까 우려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고를 떠나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물론 저도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위험에 처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동료가 구해줬던 적도 있고요. 하지만 이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한 개인과 한 개인의 일이라 생각했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제가 신경 써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당시에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양가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꼭 성적인 이슈뿐만 아니더라도) 워낙 많은 상황들을 많이 봐왔던 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때, 당위성이 하나둘 생기는 게 늘 조심스럽더라고요. 마음 아프게 바라보는 감정적인 접근 또한 무례(오만)한 것이었고(괜히 도와드리려다가 혼난 적도 많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충돌도 있었죠. 제가 일하던 포지션이 현장이 아니었음에도(저는 사무국 재무팀 소속) 그 기류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지만 그 기관에서 근무하며 (나름대로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인권에도 여전히 관심이 많고요.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요. 저는 노화의 과정 또한 장애의 과정(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치매가 오거나 다리가 불편해지는 모든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모두 언젠가 장애인이 될 거라는 거죠(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다'여기지 말고, 함께 계속 논의하면서 연대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이 글을 쓰다가 문득, 당시에 읽었던 이 책도 떠오르네요.

우리는 죽을지도 모르는 아기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 아기의 삶과 죽음 사이에 놓인 선택의 시간, 4주 반독일 전역을 감동시킨 화제의 논픽션. 임신 14주째, 콘스탄체는 배 속의 아기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로써 콘스탄체 부부는 감당하기 힘든 질문에 봉착한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아기를 끝까지 임신해야 할까?”
책장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