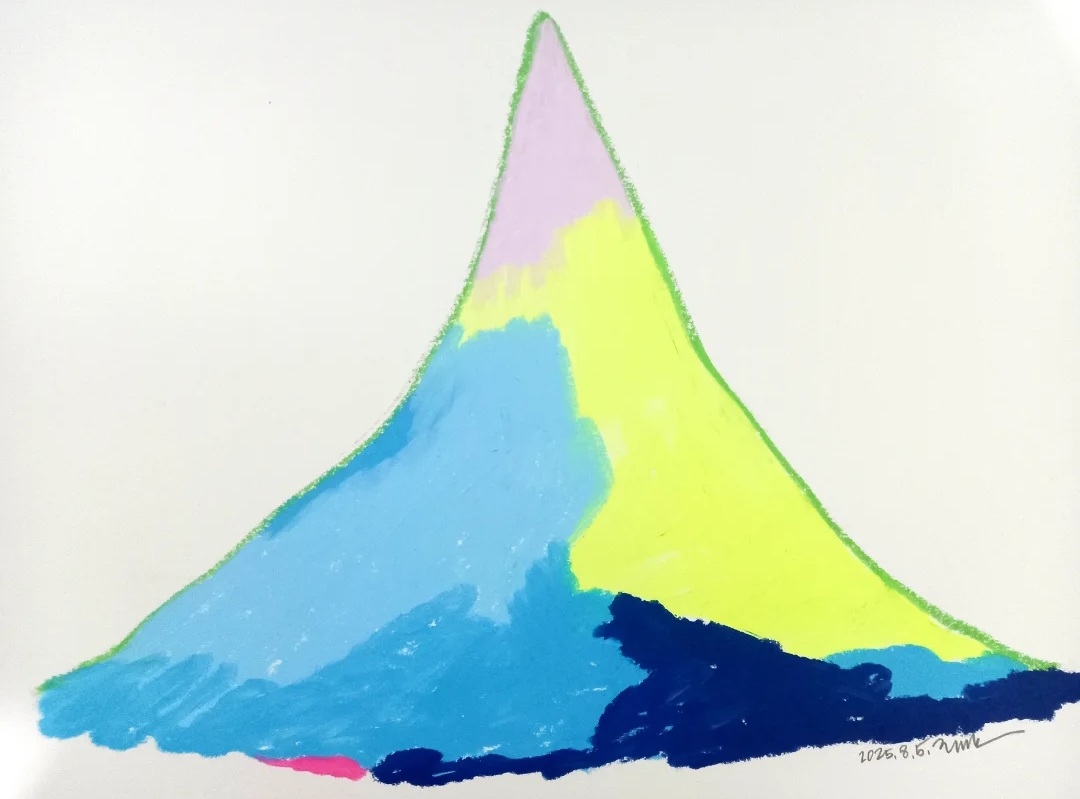“ 감추어진, 동떨어진, 미지의 원인으로 인한 현상에 접하게 될때, 사람들은 '신' 이란 단어를 흔히 사용한다. 기존 원인의 자연적 근원인 이치의 샘이 손에 잡히기를 거부할 때, 사람들은 이 신이라는 용어에 자주 기대게 된다. 원인에 이르는 실마리를 놓치자마자 또는 사고의 흐름을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게 될때 우리는 그 원인을 번번이 신의 탓으로 돌려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때까지 해오던 원인 탐구의 노력을 중단하고는 한다.... ”
『코스모스』 P.328, 칼 세이건 지음, 홍승수 옮김
문장모음 보기